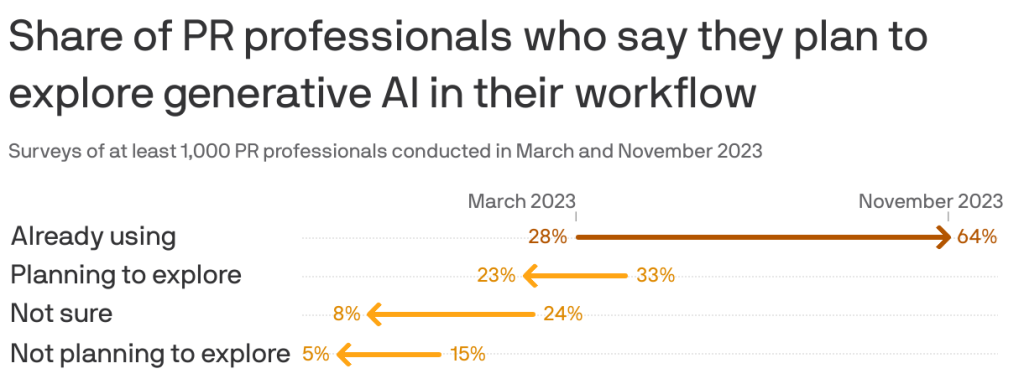Is your Instagram feed “news”? Depends on how you feel
고민하던 주제와 유사한 연구. 최근 16~25세의 네덜란드 인스타그램 사용자 111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뉴스 소비와 인스타그램 피드에 대한 반응에 대해 인터뷰한 연구다. 사용자들은 뉴스의 전통적인 정의를 이해하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접하는 거의 모든 뉴스를 전통적인 가치에 부합하지 않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소셜 뉴스라는 이유로 “뉴스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는 내용이다.
“무엇이 뉴스처럼 느껴지나요? 인스타그램 뉴스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 이라는 제목의 연구에서 네덜란드 학자 Joëlle Swart와 Marcel Broersma는 “뉴스다움”이라는 감각에 대한 이해에 두 가지 중요한 차원을 추가합니다. 이들은 특히 인스타그램의 뉴스를 살펴보고, 무엇이 뉴스인지에 대한 인지적 감각(우리가 뉴스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서적 감각(일상적인 미디어 사용에서 뉴스처럼 느껴지는 것) 사이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스와트와 브로어스마는 16세에서 25세 사이의 네덜란드 인스타그램 사용자 111명을 대상으로 뉴스 소비에 대해 질문하고,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젊은이들이 기존 뉴스를 거의 소비하지 않더라도 뉴스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예: 사실성, 중립성, 공공성)를 여전히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지적 인식과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보고 있는 뉴스에 대한 느낌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뉴스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거나 뉴스가 되기에는 너무 긍정적이거나 충분히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인스타그램의 거의 모든 콘텐츠를 뉴스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뉴스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다른 전략을 찾았습니다. 전통적인 뉴스는 ‘최신’ 또는 ‘긴급한’ 뉴스로, Instagram은 ‘논쟁적’ 또는 ‘소셜’ 뉴스로 분류하는 등 뉴스 내에서도 서로 다른 카테고리를 만들어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친구, 콘텐츠 크리에이터, 밈, 일상적인 정치 이야기 등 모든 새로운 정보를 뉴스의 범주에 포함시켜 동질화하고 본질적으로 뉴스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뉴스를 재개념화하여 전통적인 가치를 개인과 오디언스 중심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저널리스트와 마찬가지로 관련성과 근접성이 뉴스를 정의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지만, 관련성은 공적이기보다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이며 근접성은 지리적이기보다는 정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전통주의자들을 제외한 모든 그룹은 전통적으로 뉴스가 좁은 의미로 생각되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인스타그램에서 뉴스처럼 느껴지는 것에 맞춰 뉴스의 정의를 바꾸고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스와트와 브로어스마는 자신의 작업을 뉴스로 표시하는 보다 인지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데 익숙한 저널리스트들이 이러한 감성적 요소를 뉴스에 포함시키는 것은 간과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